동물 치료와 방역, 위생, ‘좋은 죽음’까지..수의학의 윤리적 틈새를 파고들다
“동물과 함께, 경계를 넘어” 수의인문사회학 신진연구자 모인 국제 심포지움 개최
서울대학교 수의인문사회학 교실이 12월 6일(토) 서울대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수의인문사회학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동물과 맞닿는 삶 속 인간-동물 관계(At the Animal Contact Zone)’를 주제로 내건 이날 심포지움은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 천명선 교수팀이 주최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주도 국제 심포지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등 해외의 신진 연구자들을 초청했다.
연자들은 인간동물학, 수의인문사회학의 이론적 틀을 동물 의료와 인간-동물 관계의 구체적 현장에 대입해 실증적 검증을 시도했다.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으로 인해 촉발된 멸종위기종 산양의 집단 폐사부터 도축장과 동물병원에서 만나는 농장동물·반려동물의 죽음, 강한 애착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죄책감으로 돌아오는 반려동물 돌봄 부담, 경제적 가치 미달로 도태되는 가축들, 유해야생동물을 막으려 덫을 놓는 농민의 슬픔까지 수의학이 간과해온 윤리적 틈새를 도전적으로 파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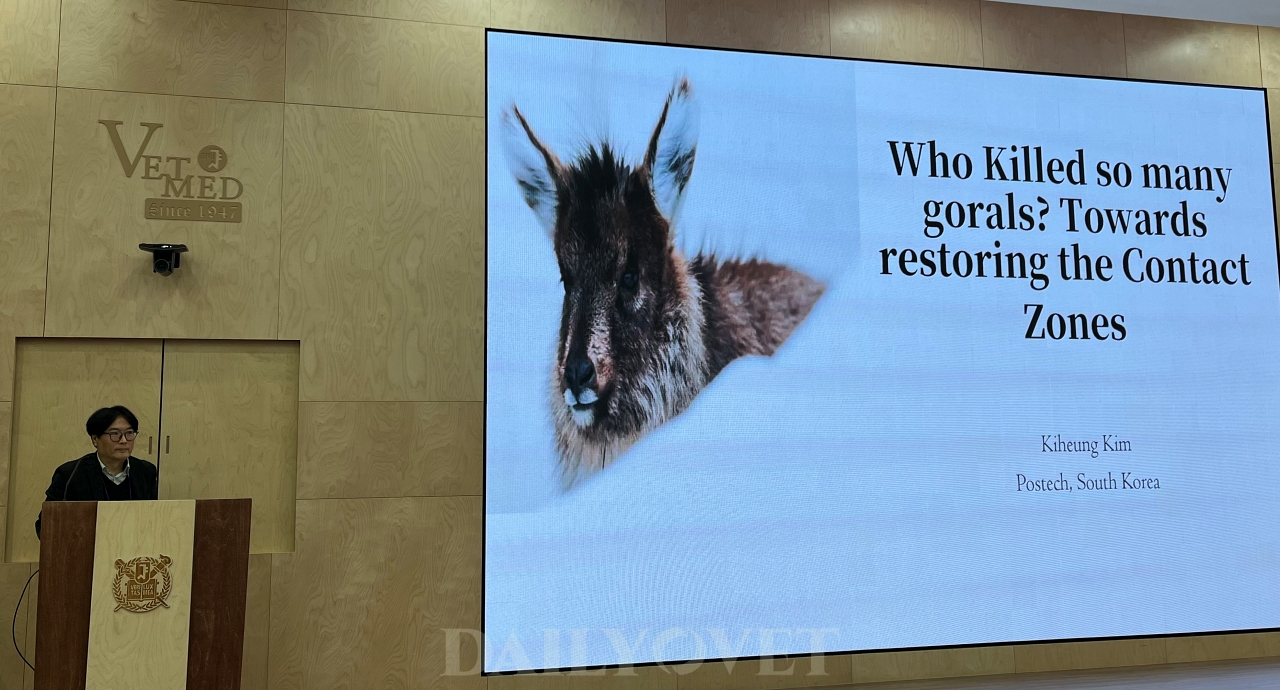
멸종위기종 산양 990마리의 죽음, ‘접촉지대’의 붕괴와 회복
심포지엄의 문을 연 김기흥 교수(포스텍, 인문사회학부)는 멸종위기종 산양의 대량 폐사 사건을 사회학적 시선으로 재구성했다.
2023-2024년 겨울 산양 전체 개체 수 추정치의 약 70%에 달하는 990마리가 폐사했다. 김 교수는 이 사건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과학적 상상력이 초래한 ‘공간 통제’의 비극”으로 정의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복원 사업으로 1,600여 마리까지 회복되었던 산양의 성과는 불과 한 번의 겨울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를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탓으로 설명했으나, 김 교수는 ASF 차단을 위해 설치된 총 연장 2,800km의 방역 울타리에 주목했다. 바이러스와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국토를 물리적으로 분획한 ‘공간 기반 방역(Space-based quarantine)’ 정책이 산양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집단 폐사를 야기한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접촉지대(Contact Zone)’ 개념을 빌려 이 현상을 분석했다. 인간과 비인간이 상호 작용하며 공존해야 할 공간을 질병 통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울타리가 ‘비움(Evacuating)’과 ‘분리(Segregation)’의 공간으로 변질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인간중심적 방역 편의주의가 생태계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공간을 통제하려 할 때, 생태적 공존의 기반인 접촉지대가 붕괴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울타리 부분 개방 등의 조치가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의 데이터 추적 및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반응하며 관계를 맺는 ‘응답 능력(Response-ability)’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해석됐다. 그는 일방적 통제와 배제가 아닌 다종(Multi-species) 간의 마주침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접촉지대’의 확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션 1: ‘치료자’로만 보는 시선 너머… 수의학의 가려진 그림자를 묻다

필수적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도축장 수의사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요한나 카그 연구원(Johanna Karg, 오스트리아 빈 수의대)은 ‘존경받는 전문직’이라는 수의사의 높은 위상 이면에 가려진, 도축장 수의사의 철저히 ‘비가시화(Invisibility)’된 노동 현실을 조명했다.
그는 대중이 수의사를 ‘하얀 가운을 입은 치료자’로만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피와 죽음(Killing)이 일상화된 도축장의 현실은 인지적으로 소거된다는 것이다.
공간적·담론적으로 배제된 도축장 수의사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임에도 기피되는 ‘더티 워크(Dirty Work)’로 간주된다. 도축장 수의사는 ‘식탁의 안전과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사회적 인정(Recognition) 대신 직업적 정체성의 혼란과 ‘낙인(Stigma)’을 감내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도축검사관 업무를 담당해야 할 수의사 공무원이 부족해지면서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간 공수의를 검사관으로 위촉하는 해법까지 강구할 정도다.
카그 연구원은 이러한 괴리를 좁히기 위한 해법으로 ‘투명성(Transparency)’과 ‘내부의 성찰’을 제시했다. 단순한 대외 홍보를 넘어, 수의사 사회 내부에서부터 도축장 수의사의 역할과 윤리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치열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집행하는 ‘죽음’의 지도를 그리다
이어 마크 J. 부벡 연구원(Marc J. Bubeck, 독일 포츠담 대학)은 수의학적 ‘죽음(Death Work)’의 양상을 사회학적으로 체계화했다.
그는 17명의 수의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좋은 죽음(Good Killing)’이 ▲실천적(Practical, 기술적 정확성) ▲정서적(Emotional, 감정 관리) ▲규범적(Normative, 정당성) 차원에서 동물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규명했다.
부벡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안락사는 보호자의 충분한 작별을 통해 비로소 ‘마지막 돌봄’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한다. 반면, 실험동물 현장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며 ‘과학적 기여’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농장동물의 죽음은 경제적 한계 상황에서 ‘방치보다는 빠른 안락사가 차악’이라는 논리로 합리화된다.
그는 “현장에서 동물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유동적(Empirical messiness)”이라고 전했다. “수의사는 단순히 죽음을 집행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이 복잡한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의 정당성’을 협의하고 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부벡은 죽음의 노동을 금기시하지 않고, 도덕적 협상이 이루어지는 전문성의 핵심 영역으로 인정할 것을 제언했다. 수의계와 사회 전반에서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좋은 죽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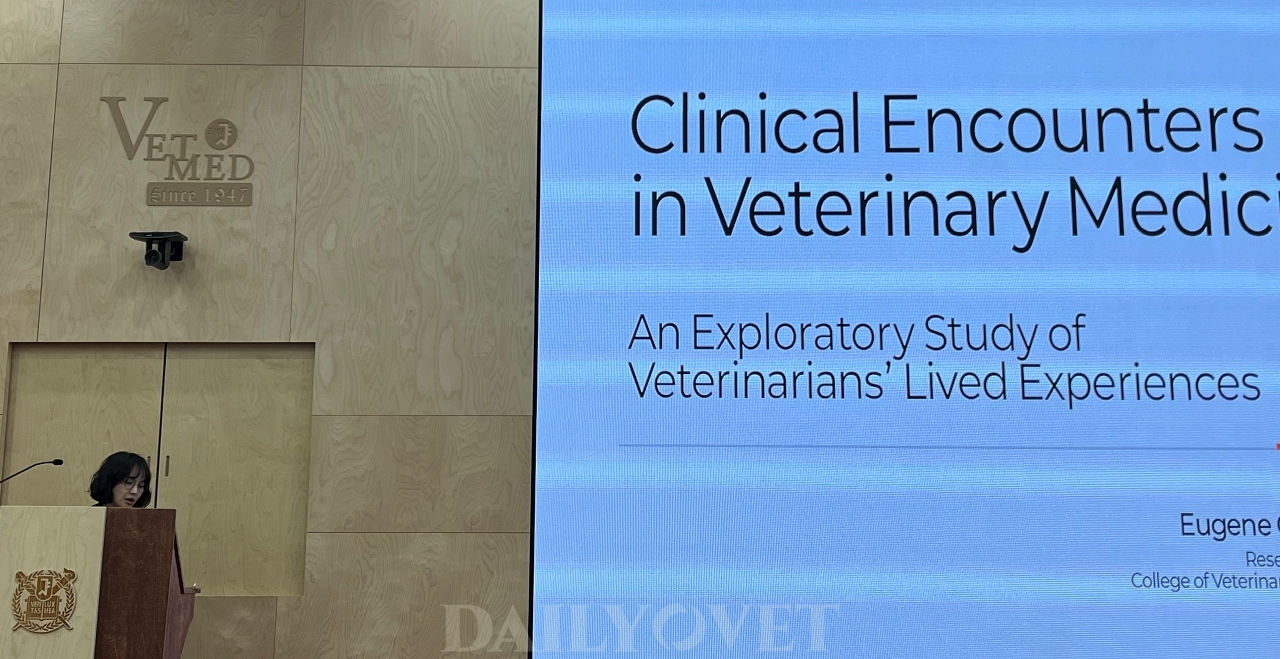
‘의학적 해석학’으로 바라본 수의사의 동물 진료
최유진 연구원(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 연구실)은 기존 수의학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보 수집과 보호자 설득이라는 ‘기능적 기술(Skill)’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치료의 본질인 ‘동물의 몸(Lived Body)’을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의학적 해석학(Medical Hermeneutics)’이다. 이는 진료를 ‘환자라는 텍스트’를 독해하여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한다.
동물 암환자 진료 현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료 단계를 재구성한 시도도 소개했다.
가령 문진(History Taking)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보호자의 삶과 동물의 변화를 연결하며 ‘우리(We)’라는 치료적 연대감을 쌓는 과정이다.
신체 검사(Physical Exam)와 진단 검사(Diagnostic Data)의 의미 차이도 선명하게 부각했다.
신체검사는 수의사가 동물의 몸과 직접 교감하는 순간이다. 이때 동물의 몸은 수동적 객체를 넘어, 수의사의 윤리적 판단을 이끄는 ‘능동적 참여자(Active participant)’가 된다. 진단 검사는 객관적이고 ‘확장된 시각’을 제공하나, 그 자체로 완벽한 정답은 아니다. 최 연구원은 “데이터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여전히 수의사의 주관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과학적 데이터는 진료의 우위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며, “수의학적 만남은 보호자의 서사, 동물의 살아있는 몸, 진단 데이터가 통합되어 환자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나가는 다층적인 해석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션 2: 애착과 죄책감 사이, ‘돌봄’이라는 이름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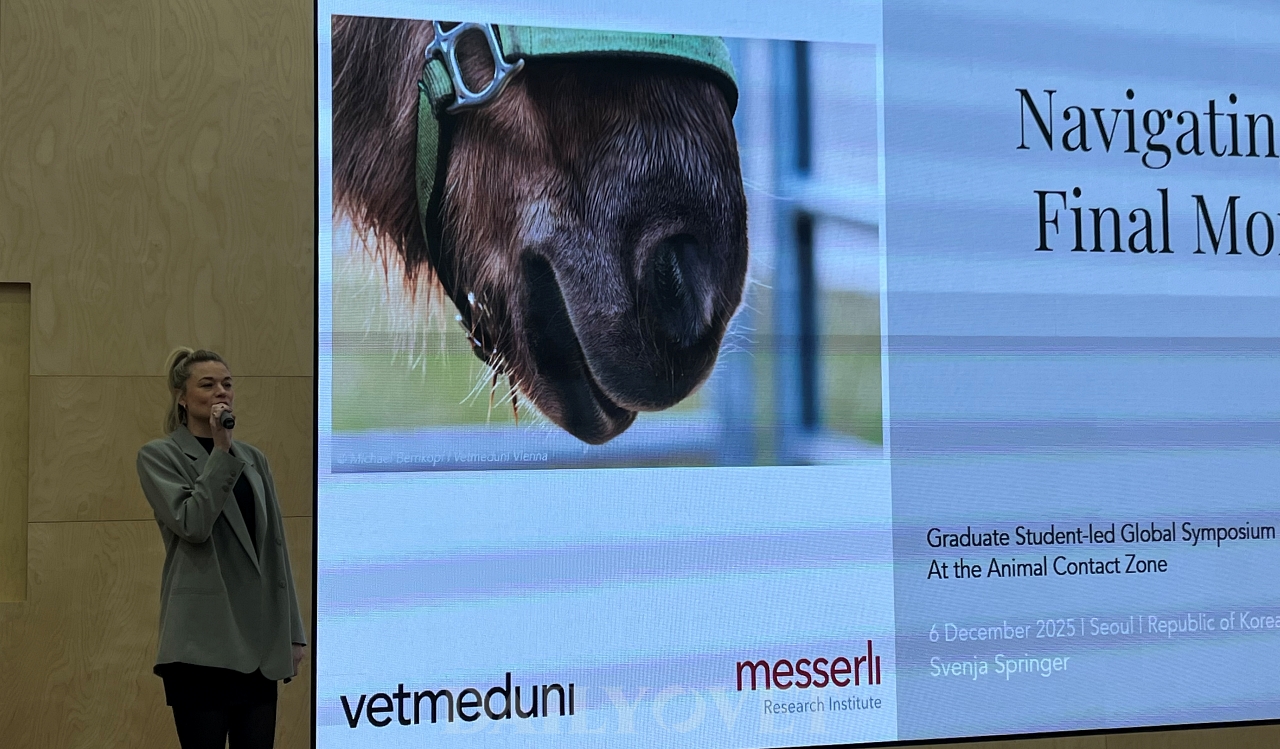
동물 안락사 상황에 놓인 보호자의 이중적 태도
스벤야 스프링어 박사(오스트리아 빈 수의대)는 말(Horse) 안락사를 둘러싼 보호자의 심리를 사회학적으로 포착했다.
그는 말의 안락사를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닌 ‘사회적 사건’으로 전제했다. 소동물과 달리 마구간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승마 커뮤니티 등 타인의 시선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스프링어 박사는 보호자들이 겪는 ‘인지적 부조화(Ambivalence)’에 주목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0%는 안락사 옵션에 감사를 표했으나, 동시에 약 30%는 근본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젊은 여성 보호자 계층에서 심리적 갈등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안락사 후 죄책감과 비탄(Grief)을 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느꼈다. 스프링어 박사는 이를 여성을 주된 ‘돌봄 수행자(Caring gender)’로 여기는 사회적 맥락 탓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인식이 안락사 결정에 대한 도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기대하는 역할 또한 역설적이다. 정서적으로는 안락사 전후 ‘충분한 작별의 시간(82%)’을 원했으나, 기술적으로는 과정이 ‘신속하게(78%)’ 끝나기를 바랐다. “보호자는 기술적으로 고통 없는 죽음을 원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충분한 애도 과정을 필요로 한다”며 수의사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스프링어 박사는 수의사가 단순한 ‘시술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호자의 결정이 최선이었음을 지지해 주는 ‘도덕적 위안자(Moral comfort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보호자의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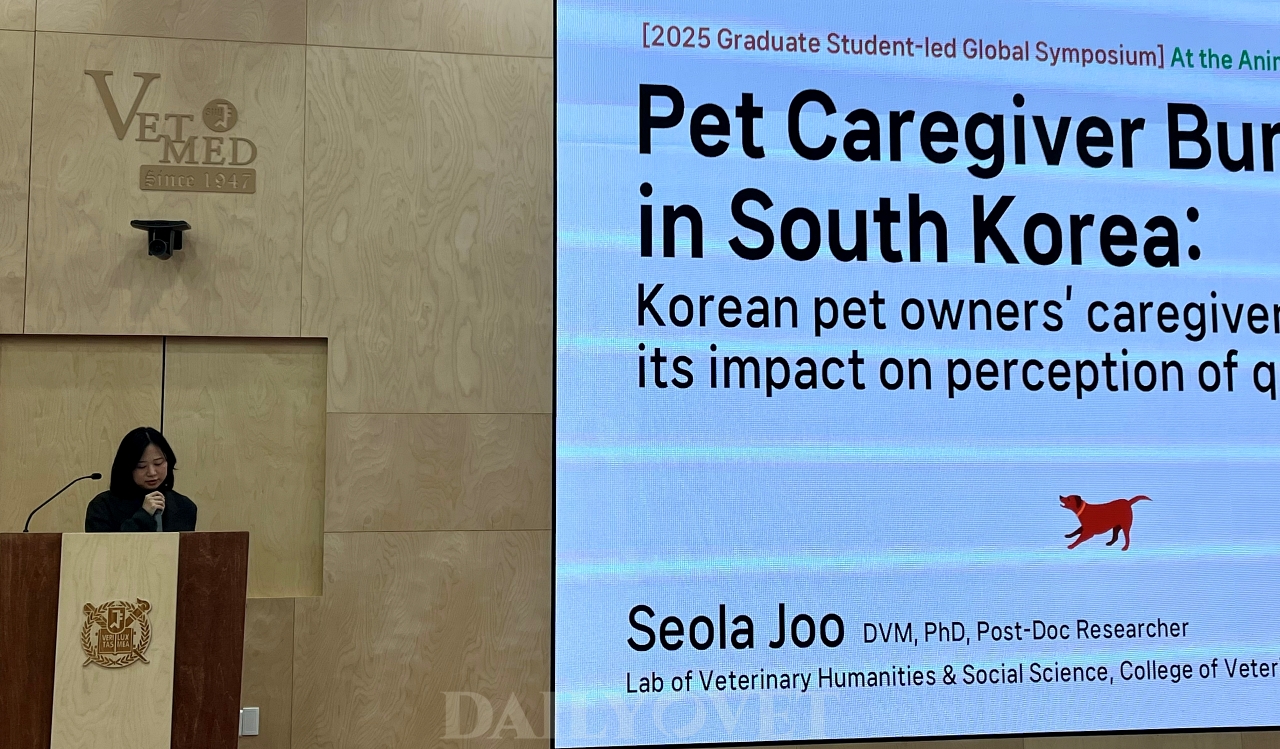
반려동물에 대한 강한 애착이 돌봄 강박과 죄책감으로 ‘애착의 역설’
주설아 박사(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는 한국 반려동물 양육자 2,002명(분석 대상 주 양육자 1,69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호자가 체감하는 ‘돌봄 부담(Caregiver Burden)’의 실체와 사회적 배경을 조명했다.
주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보호자들의 평균 돌봄 부담 점수는 11.4점(7-item Zarit Burden Interview)에 달했다. 이는 홍콩의 ‘반려동물 암 환자’ 보호자 평균(9.8점)을 상회하는 수치로, 한국 보호자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의 강도를 시사한다.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는 보호자와 동물의 낮은 연령, 만성질환 여부와 함께 ‘입양 전 준비 부족(51.8%)’과 초기 적응의 어려움, 이웃 갈등 등이 꼽혔다.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규범적 압박(Normative Pressure)’이 낳은 ‘애착의 역설’이 청중의 주목을 받았다.
주 박사는 높은 애착이 양육의 기쁨이 되는 대신, ‘완벽한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과 죄책감(Guilt)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미디어와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이 보호자들을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타인의 시선 속에 가두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주 박사는 “돌봄 부담은 단순히 돌봄 비용과 같은 하나의 요인에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며 기존의 환원주의적 시각을 비판했다. 연구 결과 높은 돌봄 부담은 보호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저하로 직결되며, 이는 다시 돌봄 부담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양방향적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법으로 ‘입양 전 교육(Pre-adoption education)’과 ‘맥락을 고려한 관계 중심적 지원(Relational, context-sensitive support)’을 제시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와 동물의 안녕(Wellbeing)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시스템과 수의사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세션 3: 시스템에 갇힌 생명들… ‘공존’을 위한 구조적 해법은?

태어나자마자 도축·방치되는 ‘소외된 동물들’
3부의 문을 연 사라 E. 볼튼 박사(Sarah E. Bolton, 캐나다 UBC)는 현대 식량 생산 시스템에서 경제적 가치 미달로 주변부로 밀려난 ‘소외된 동물(Marginalized animals)’들의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진단했다.
볼튼 박사는 호주 낙농 산업의 ‘잉여 송아지(Surplus calves)’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젖소는 우유 생산을 위해 매년 출산을 해야 하지만, 이때 태어난 수송아지나 잉여 암송아지는 착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치 없는 존재’로 분류된다. 이들은 생후 5일 만에 도축(Bobby calf)되거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는 등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근본 원인으로 ‘도덕적 고착(Moral Lock-in)’을 꼽았다. 농장주들 또한 갓 태어난 송아지의 죽음에 윤리적 불편함을 느끼지만, 소고기 가격 변동과 같은 거대 경제 시스템이 그들을 비윤리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결과, 소고기 가격 하락과 잉여 송아지의 조기 도축률 급증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볼튼 박사는 “가치에 따른 동물의 주변화는 개별 농가의 윤리성에 호소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농장 단위를 넘어선 거시적 접근인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을 제시하며, 전체 가치 사슬(Value chain) 차원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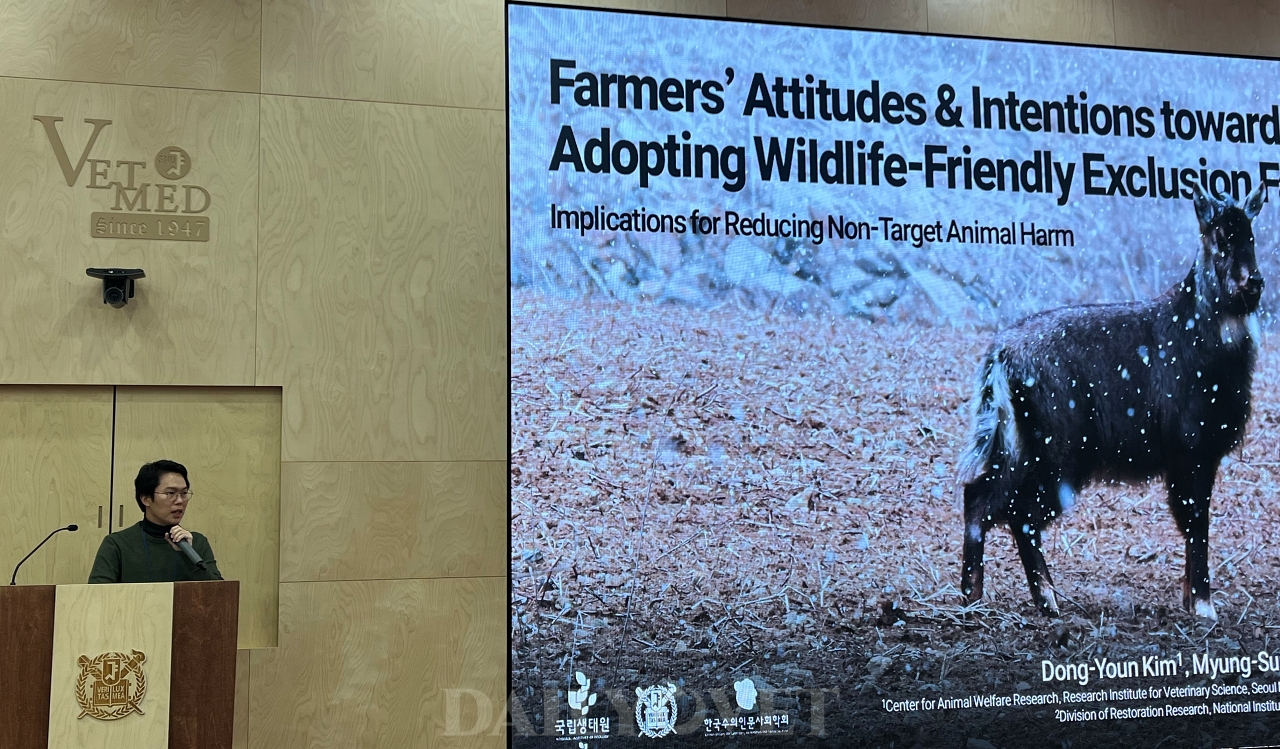
농작물 지키려 야생동물 덫 놓는 농민들에게도 슬픔은 있다
마지막 연자로 나선 김동윤 연구원(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은 ‘야생동물 친화적 농작물 피해예방시설(WFEFs)’ 도입에 대한 농민들의 태도를 분석했다. 단순한 물리적 차단을 넘어,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김 연구원은 먼저 농가에서 널리 쓰이는 ‘그물망’의 폐해를 진단했다. 그물망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지정유해동물 뿐 만 아니라 노루나 오소리는 물론,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까지도 얽혀 죽게 만드는 ‘생태계의 덫’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농민들이 그물망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차단력(37.1%)’과 ‘내구성(16.8%)’이라는 실용성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농민들의 내면에서 변화의 단초를 발견했다. 설문 결과 농민들은 야생동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물망에 걸려 죽거나 다친 동물을 목격했을 때는 ‘슬픔(13.9%)’을 느끼는 양가성을 보였다. 작물 피해는 줄이지만 야생동물은 잘 살아야 한다는 농민들의 이러한 측은지심이 야생동물 친화적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도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보조금의 역설’이 눈길을 끌었다. 농민들에게 보조금 관련 언급 없이 야생동물 친화적 예방 시설 도입 의향만을 물었을 때 66.5%가 긍정적이었으나, ‘정부 보조금 50% 지급’ 조건을 제시하자 오히려 설치 의향이 52.5%로 감소한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일부 전통주의적 성향을 가진 농민들은 보조금을 혜택이 아닌 ‘외부적 간섭’이나 ‘정부의 통제’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야생동물 정책에서 보조금이 심리적 저항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김 연구원은 “행정 편의주의적 보조금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을 계몽의 대상이 아닌 ‘공감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그들의 측은지심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비용 500만 원 미만의 저비용 기술 개발 ▲농민 정서를 고려한 공감 기반 교육 ▲농민 개별적 설치 대신 마을 단위나 인접 농경지 단위로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기술과 정서가 결합된 통합적 해법을 제안했다.
김민지 기자 jenny030705@naver.com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