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침묵이 백 마디 말보다 감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곤 한다. 나의 아침은 언제나 ‘눈’으로 시작된다. 문을 열면 아픈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찾아오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한다.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언어로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축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기에 나는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처럼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 아픔, 외로움, 귀찮음, 스트레스 같은 감정들이 표정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병원이기에 ‘아프다’는 표정을 짓는 동물들을 가장 많이 마주한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보호자가 진료에 실마리가 될 단서들을 들려준다. 밤새 기침을 했다거나, 기력이 없다거나, 열이 난다는 등의 정보들이다.
초보 수의사 시절에는 보호자가 주는 정보를 100% 믿었다. 하지만 10년 넘게 임상 경험을 쌓다 보니, 이제는 그 말들을 가려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환축 중에는 아프지 않은 경우도 많다. 경력이 쌓일수록 동물의 세밀한 표정을 읽어내는 눈이 깊어지기에, 때로는 보호자가 만들어 내는 ‘정보의 소음’에서 잠시 귀를 닫고 그들의 표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병원으로 소포가 하나 도착했다.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보낸 주소에는 “그동안 치료 잘 받았습니다”라는 짧은 인사가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마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책의 제목과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는데 문득 얼굴이 화끈거렸다. ‘혹시 진료 중에 내뱉은 무심한 말실수로 보호자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내가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날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들었다.
불교와 유학에서는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을 ‘칠정(七情)’이라 하여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으로 분류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 감정을 주로 말과 글로 나타낸다. 글은 퇴고가 가능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기에 말은 글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야 한다. 말을 하기 전 3초 만이라도 머릿속으로 퇴고의 과정을 거친다면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진료를 하다 보면 보호자와 환축의 표정이 무척이나 닮아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처음부터 비슷한 외모의 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했을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감정을 공유하며 살다 보니 서로의 결이 닮아가는 것일 게다. 세월이 흐를수록 닮아가는 노부부의 얼굴처럼 말이다.
88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굴렁쇠 소년’이다.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소년의 정적. 그 1분간의 침묵을 보며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고 어떤 이는 기도를 올렸다. 이를 기획한 이어령 교수는 운동장이라는 원고지 위에 ‘한 편의 시’를 쓰고 싶었다고 한다. 번잡함은 생각이 스며들 틈을 주지 않지만, 여백이 있는 시나 글은 읽는 이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비치는 거울이 된다. 침묵이 때로 말보다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수의사 역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찰나의 표정과 행동에서 상대의 성격이 읽히곤 한다. 그가 살아온 세월의 궤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첫인상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 아우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공자는 사람의 됨됨이를 9등급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높은 ‘성인 군자’와 가장 낮은 ‘9등급’의 공통점이 둘 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인은 이미 완성되었기에 변할 필요가 없지만, 9등급은 타인의 좋은 조언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없기에 머물러 있다. 8등급과 9등급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변화하려는 의지’에 있다. 9등급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독서와 명상을 통해 죽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결국 말로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언어를 퇴고하고, 동물의 침묵 속 언어를 더 세밀하게 읽어내며, 내 얼굴에 새겨질 삶의 흔적을 정성껏 닦아나가는 일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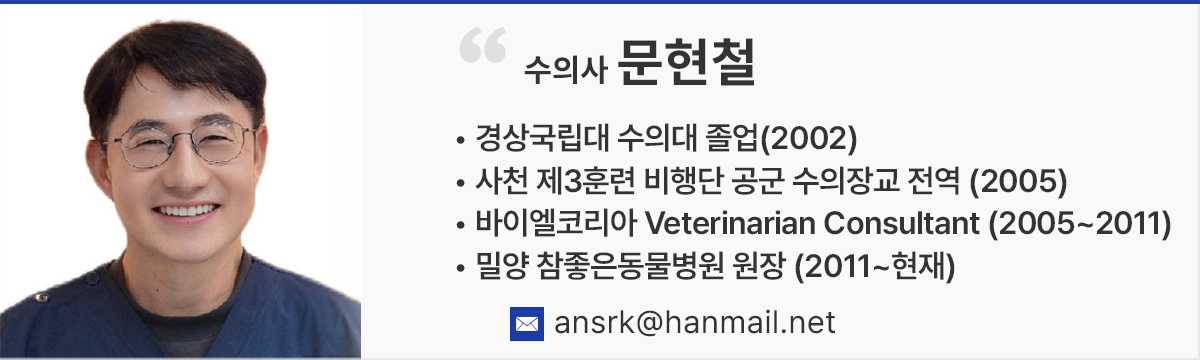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